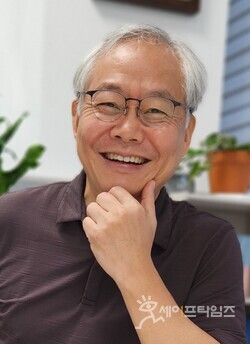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한도가 각 금융기관 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의 5000만원 한도는 2001년에 정해졌다. IMF 외환위기로 여러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겪은 후였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매한가지다.
COVID19 위기에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2023년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Bank Run)과 같은 금융불안이 생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한 때 검토되기도 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위기 때 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즉각적으로 꾸준히 올려왔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건으로 금융위기가 생기자 미국은 긴급경제안정화법(EESA·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을 통해 예금자보호한도를 25만달러로 높였고, 거래계좌보증프로그램(TAGP·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으로 일시적으로 거래계좌에 대해 예금을 전액 보장해 신속하게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
2023년에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자 FDIC는 해당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신탁은행에 넘기고, 일부 예금에 대해 전액 보장을 제공했다. 사태가 진정되자 FDIC는 미 의회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추가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느껴지는가?
미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FDIC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해 금융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전액 보장이라는 예외적인 조치도 주저하지 않았다.
의회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적극적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요구한다.
반면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어떤가?
말 그대로 소액 예금자 보호라는 소극적 기능 수행에 그친다. 예금자 보호가 진짜로 필요했던 새마을금고 사태 때 불안 심리에 빠진 예금자가 금고 앞 줄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제도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직접 책임이 있으나 예금보험공사도 사태 수습에 적극적 역할을 했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소극적인 가운데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시중은행 등이 총 출동해 신뢰회복 카드와 유동성 지원에 대한 약속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겨우 사태 수습의 가닥을 잡았다.
그러다 보니 약발이 듣는데 시간이 걸렸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예금자보호법은 개정됐지만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또 1년을 기다려야 본격 시행된다.
미국과 한국의 금융환경과 국민 정서가 다른 탓도 있겠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위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어느 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국은 선제적이며 한국은 사후 약방문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돼 다행이다.
하나는 해결됐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조기에 안정되려면 미국 FDIC와 같이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에도 금융시장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 하나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일이다.
■ 안경희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지속가능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나사렛대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련기사
- [안경희 칼럼] '빽햄 논란' 더본코리아만의 문제일까?
- [안경희 칼럼] 자본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금통위를 기대한다
- [안경희 칼럼] '자기주식의 마법' 규제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해야
- [안경희 칼럼] 대한민국 지배구조 '대개혁' 필요하다
- [안경희 칼럼] '올빼미 공시' 차단, 제도개선책 시급하다
- [안경희 칼럼] 하이브 상장 첫날 주가 왜 내렸나
- [안경희 칼럼] 롯데케미칼 왜 위기에 빠졌나
- [안경희 칼럼] 삼성전자 ROE,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유
- [안경희 칼럼] 진정성 의심 '금양 무상증여' 기우일까
- [안경희 칼럼] '천재의 꼼수'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 [안경희 칼럼] 3곳에 빚진 SK하이닉스
- [안경희 칼럼] 밸류업 프로그램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 [안경희 칼럼] 삼성전자는 왜 HBM을 못할까?
- [안경희 칼럼] 신뢰 잃은 금양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난제
- [안경희 칼럼] '아름다운 동행' 영풍·고려아연 종말은
- [안경희 칼럼] '100% 손실' 못 믿을 해외 부동산펀드
- [안경희 칼럼] 또 터진 500억원 옵션 양매도 손실
- [안경희 칼럼] 부실운영 우리금융 평가등급 하락하나?
- [안경희 칼럼] 780억 이자부담 중소판매자에게 떠넘긴 티메프
- [안경희 칼럼] 강압적인 지분 매입 CJ프레시웨이 떳떳한가?
- [안경희 칼럼] '계파싸움 + 관치금융' 문제아 전락한 우리금융
- [안경희 칼럼]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해야 할 문제는?
- [안경희 칼럼] 산업은행 이전 과연 타당한가?
- [안경희 칼럼]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 [안경희 칼럼] ‘채권 돌려막기’ 제재가 2년이나 걸린 이유
- [안경희 칼럼]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이 신용평가사에 던진 숙제
- [안경희 칼럼] 금양의 미래는 무엇에 달렸나?
- [안경희 칼럼] 홈플러스 사태에서 이익 본 자는 누구인가?
- [안경희 칼럼] 삼성SDI 유상증자 공시일에 생긴 '의혹'
- [안경희 칼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의심받는 이유
- [안경희 칼럼] 우리금융지주만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이유는?
- [안경희 칼럼]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RCPS 투자에서 간과한 것은?
- [안경희 칼럼] 증권업계 '안전한 IT시스템' 시급하다
- [안경희 칼럼]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 [안경희 칼럼] 사내유보금, 과연 쓸데없이 쌓아둔 돈일까?
- [안경희 칼럼] SK, 삼성처럼 '슈퍼을' 한미반도체 도태전략 쓰나
- [안경희 칼럼] 산은의 한화오션 지분 매각 비난할 일인가?
- [안경희 칼럼]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안경희 칼럼] MG손보 '리스크관리'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 [안경희 칼럼] SPC 재무제표에 '사망사고' 징후가 보인다
- [안경희 칼럼] 이재명 정부 '경제강국' 정책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