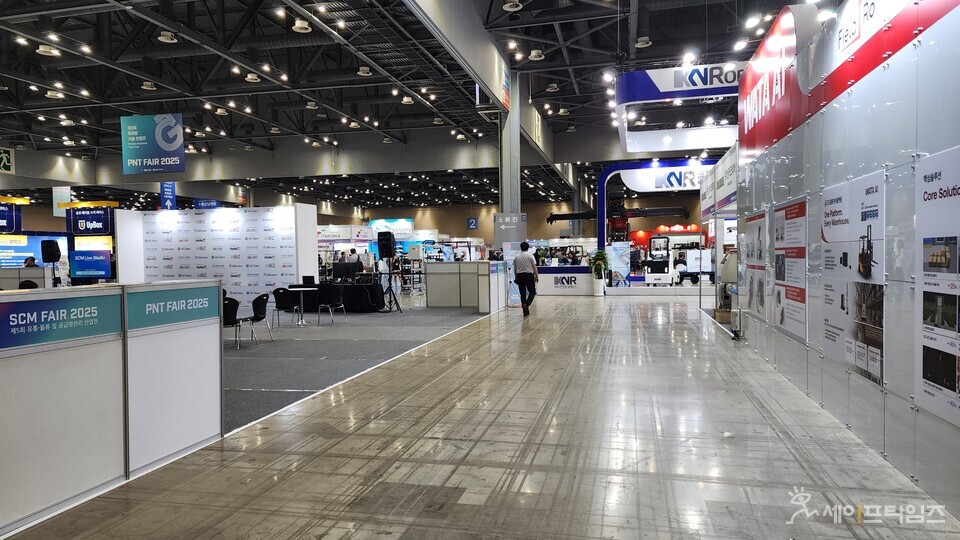
산업 현장은 지금 '스마트 자동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사람 대신 로봇이 물건을 옮기고, 센서와 데이터가 공정을 제어한다. 효율은 높아지고, 인건비는 줄고, 사고율도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기업이 "이제 현장은 더 안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요즘 사고는 사람이 다치는 형태보다 더 복잡하고, 더 은밀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기계가 멈추고, 시스템이 멈추고, 결국 모든 것이 서서히 멈춘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다운된다.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위험이다.
자동화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신, 하나의 설비나 신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든다. 센서 하나, 모터 한 대, 제어기의 오류가 전체 시스템을 멈추게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사람의 실수를 줄이는 구조'가 오히려 '기계의 멈춤에 취약한 구조로 변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물류센터나 생산라인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통신 장애로 몇 시간 동안 전체 설비가 정지한 사례가 빈번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로 인한 생산 차질과 비용 손실은 엄청나다. 안전을 사람의 부상 여부로만 판단한다면 이런 사고는 대단한 뉴스거리가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시스템 안전의 실패다.
문제의 근본은 기술에 대한 과신이다. 자동화는 안전을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위험은 더 정교해지고, 통제는 더 어려워진다. 인공지능이 설비를 감시하고, 예지보전 알고리즘이 고장을 예측한다고 해도, 모든 판단은 결국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정상 상태란 착각에 불과하다.
먼지와 진동, 네트워크 지연, 작은 전류 이상 하나가 예기치 못한 정지를 일으킨다. 스마트 기술은 사람의 실수를 줄였지만, 대신 '작은 고장이 시스템전체를 멈추는'위험을 만들어버렸다. 산업현장으로서는 재앙이다.

이제 안전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사람의 부상을 막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이 멈춰도 전체가 버티는 구조, 즉 복원력이 필요하다.
기계가 고장나도 일부는 작동을 유지하고, 데이터가 끊겨도 대체 경로를 통해 복원되는 구조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의 이중화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통신 단계에서도 분산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에는 언제나 '수동 개입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완전히 빠진 시스템은 위험하다. 자동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스마트 자동화의 시대에 진짜 안전이란,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 많은 센서와 더 빠른 AI를 도입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정작 '멈췄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안전이란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자동화의 목적은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흔들릴 때도 사람이 믿고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스마트는 편리함의 상징이지만, 그 편리함이 지나치게 매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을 감추게 된다. 진짜 스마트한 기술은 멈추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멈춰도 무너지지 않는 기술이다.
그것이 자동화 시대의 새로운 안전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인간의 역할이다. 스마트 자동화의 물결이 거셀수록 인간의 역할은 더 정교하고 단단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