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ㆍ간편결제 등 신기술 등장에 규제 속수무책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ㆍ카카오의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 2014년 정부가 내렸던 유일한 시정 조처가 IT(정보기술) 발전의 물결에 흔들리고 있다.
스마트폰 등 신기술의 여파로 인터넷 공간의 정의나 포털 사업의 범위가 크게 달라졌지만, 낡은 규제의 한계 탓에 시정안의 취지가 훼손돼도 달리 손을 못 쓰는 경우가 잇따르는 것이다.
10일 IT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3월 네이버ㆍ다음(현 카카오)의 검색 지배력 남용에 관해 내린 동의의결 처분은 PC만 대상으로 했을 뿐 모바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2013년 당시에는 모바일 검색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조사ㆍ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스마트폰으로 포털 검색을 하는 비율이 PC를 추월하면서 모바일 공간은 동의의결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예컨대 동의의결안은 "이용자가 검색광고와 순수 검색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검색광고는 광고 영역에 노란색 음영 처리를 하라"고 규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애초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 원칙을 지켰지만, 작년 카카오가 모바일 검색광고에서 음영 처리를 벗겨내 파문이 일었다.
네이버도 작년 11월 선보인 새 검색광고인 '쇼핑검색 광고'에선 모바일판 음영 처리를 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쇼핑검색 결과 옆에 다른 가격비교 사이트로 가는 링크(경로)를 달아야 한다는 동의의결안도 모바일에서 지키지 않다가 이번 달에야 링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모바일에서 '검색 지배력의 남용 방지'라는 동의의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공정위는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PC만 대상으로 했던 2014년 결정을 모바일 부문에 강제 적용할 근거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최근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의 가맹주에만 유리하도록 검색광고 정책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런 시도도 동의의결안에 근거해 막을 길이 없다.
2013∼2014년 당시 국내에선 간편결제 서비스란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N페이는 2015년 6월 첫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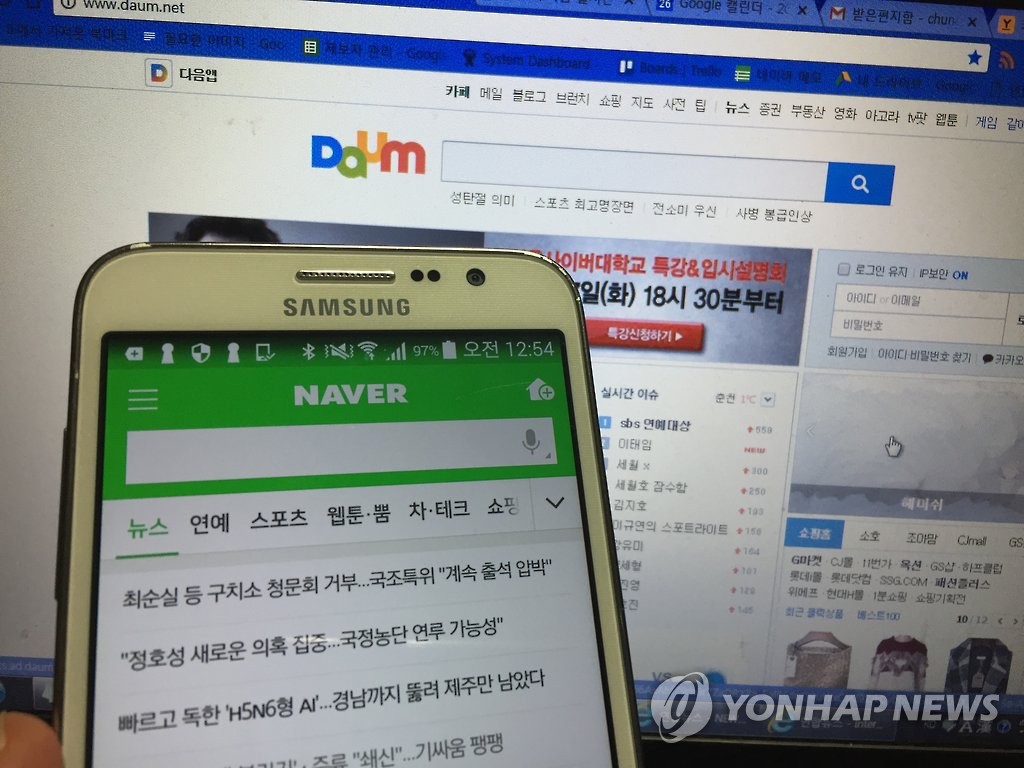
기술 발전에 맞춰 공정위의 규제도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공정위가 당장 규제를 보완하기도 쉽지 않다.
3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네이버 등의 행위가 당시처럼 경쟁제한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경제 분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전자상거래·마케팅 플랫폼(서비스 공간)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등 현재 시장 상황은 3년여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 터라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게 더 쉽지 않다.
당시 공정위가 네이버ㆍ카카오 정책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데에도 직권조사부터 무려 10개월이나 걸린 만큼 최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공정위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IT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인터뷰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런 공정위의 최근 내부 분위기에 비춰보면 대형 포털의 '갑질' 논란이 확산하면 조만간 국내외 IT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이를 교묘히 악용해 공익과 시장정의를 해칠 여지가 있는 만큼, 합리적 규제 보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시민 사회 일각에서 적잖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검색광고 등의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