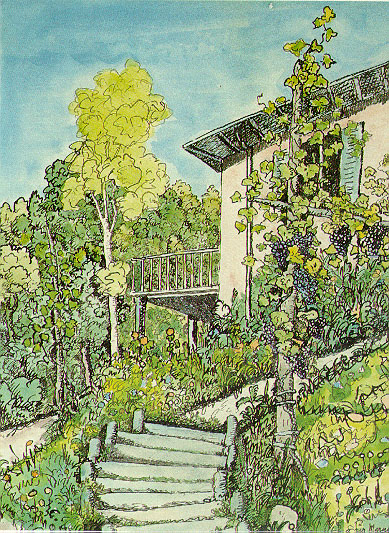
"꽃들은 다른 꽃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향기와 씨앗을 보내지. 하지만 씨앗이 적당한 자리에 떨어지도록 꽃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바람이 하는 일이야.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곳저곳으로 불어댈 뿐이지…"
바람이 되고 싶은 사내가 있었다. 그것이 자기의 의지 때문이었는지, 첫사랑이 던져준 가시 때문이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사내는 바람처럼 떠돌아다녔다. 꽃 위에 슬며시 앉아 배시시 웃는 귀여운 꽃잎에 입맞춤하고 달아나기 일쑤였던 사내. 그의 이름은 크눌프다. 헤르만 헤세가 아끼고 사랑한 인물이자, 그의 분신이기도 했던 이름, 크눌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는 <크눌프>에서 바람과 같은 사랑을 그렸다. 형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내를 그렸다. 크눌프는 만나는 여자마다 호감을 느끼게 하는 외모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언변과 시를 짓는 낭만까지 두루 갖춘 사내였다.
그는 가정을 이루고 사랑에 정착하는 생활보다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살아갔다.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이 자연을 벗 삼아 떠돌아다니는 그를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크눌프>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첫 번째 이야기 '초봄'은 크눌프가 무두장이인 친구 로트푸스의 집에 머물면서 벌어진다. 그는 로트푸스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진한 처녀와 무도회를 즐기다, 미련도 없이 봄을 만나러 떠난다.
두 번째 이야기 '크눌프에 대한 나의 회상'에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길을 떠나는 크눌프의 호방한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는 바람의 아들 크눌프가 방랑자의 길로 들어선 이유가 나온다.
세 번째 이야기 '종말'은 폐병이 걸린 크눌프가 고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 관한 이야기다. 결국, 그는 첫눈이 내리는 날, 신과 대화를 나누며 눈에 파묻혀 자연으로 돌아간다.

"부드럽고 매혹적인 형형색색의 불꽃이 어둠 속으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금세 그 속에 잠겨 사라져버리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안타깝게 그리고 더 빠르게 사그라져 버려야만 하는 모든 인간적 쾌락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랑자인 크눌프는 안정된 직업도, 안정된 가정도, 안정된 사랑도 원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첫사랑의 상처를 잊게 해줄 야생화 같은 여자가 더 절실했는지 모른다.
그의 애정 형태는 '프리섹스'라 할 수 있겠고, '원 나잇 스탠드'라 부를 수도 있을 터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러한 프리섹스를 갈망한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맘껏 사랑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내세우며 프리섹스는 많은 이를 유혹한다. 그리고 형체도 없는 사랑에 청춘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여기서 잠깐, 말 그대로 프리섹스는 자유로울까.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누워 있는 – 만리장성의 벽돌 백 개쯤 거뜬하게 쌓고도 남았을 것 같은 – 이에게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자유인가.
그리고 밤이 되어 다시 새로운 파트너와 새로운 섹스를 하는 게 자유로운가 말이다. 크눌프가 그러했듯 심연까지 닿은 고독이라는 고드름이 폐부를 꿰뚫어 바람의 통로가 되어버렸는데도 그걸 자유와 낭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누군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라 할 수 있다. 오늘도 사랑에 안착하지 못하고, 섣부른 섹스 카운트에 목을 매는 철부지들이여. 그대들의 발에 채워진 족쇄가 보이지 않는가.
그대들의 몸을 박살 내는 부질없는 바람 맞이는 그만두시고, 그 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집을 지으시길. 그 아름다운 하우스에서 안정된 섹스에 주력하시길. 괜히 크눌프처럼 바람에 강펀치를 맞고 폐병에 걸려 이른 종말을 맞기 전에, 안정된 사랑에 취해 잠드시길.
관련기사
- [그 성에 가고 싶다] 성숙한 관계를 훼방하는 섹스 로봇
- [그 성에 가고 싶다] 질투가 존재하지 않는 섹스란 없다
- [그 성에 가고 싶다] 착한섹스와 나쁜섹스의 '아우성'
- [그 성에 가고 싶다] 첫 섹스의 아련한 기억
- [그 성에 가고 싶다] 불소통의 섹스는 폭력이다
- [그 성에 가고 싶다] 섹스리스에 대한 카뮈의 경고
- [그 성에 가고 싶다] 인간이 가진 성적욕망의 이중성
- [그 성에 가고 싶다] 포르노그라피아와 '뇌의 섹스 어필'
- [그 성에 가고 싶다] '현명한 섹스'를 위한 묘약
- [그 성에 가고 싶다] '마담 보바리'와 성적 판타지
- [그 성에 가고 싶다] 설국에 피어난 '에로티시즘'
- [그 성에 가고 싶다] 황혼의 로맨틱한 섹스
- [그 성에 가고 싶다] 키스해도 될까요 ?
- [그 성에 가고 싶다] 당신의 사랑은 해피엔딩인가요
- [그 성에 가고 싶다] 벚꽃처럼 만개한 '사랑의 비밀'
- [그 성에 가고 싶다] 야성의 사랑, 그 뜨거움에 대하여
- [그 성에 가고 싶다] 모호한 사랑과 독립적인 섹스
- [그 성에 가고 싶다] 외계인과의 아찔한 사랑
- [그 성에 가고 싶다] 섹스의 피라미드 계급을 타파하라
- [그 성에 가고 싶다] 오늘, 사랑을 잡아라
- [그 성에 가고 싶다] 아름다운 자극으로 깨어나라
- [그 성에 가고 싶다] 사랑의 온도는 36.5
- [그 성에 가고 싶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은 없다
- [그 성에 가고 싶다] 고정관념의 벽을 무너뜨리는 섹스
- [그 성에 가고 싶다] 영원한 사랑은 언제나 그대 곁에

